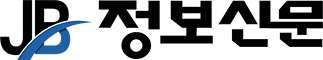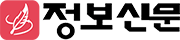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
우선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들 명칭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시절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경부선은 경성(서울의 옛 지명)과 부산을 잇는다는 뜻, 호남선은 호남 지역을 지칭한다는 식이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의 편의와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붙인 이름이다. 오늘날 우리는 독립된 국가로서 스스로의 언어와 정체성을 갖추었지만, 철도 명칭만큼은 여전히 제국의 잔재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세계의 기준을 보자. 일본 신칸센은 ‘도카이도 신칸센’, ‘산요 신칸센’처럼 지역 이름을 쓰지만, 이는 자국 전통에 맞춘 것이고 무엇보다 자국민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프랑스는 ‘파리–리옹선’, 독일은 ‘베를린–함부르크선’처럼 주요 도시를 곧장 드러낸다. 미국 역시 ‘보스턴–워싱턴 노선(NEC)’처럼 지명을 기반으로 한다.
해외 여행객은 철도 노선명을 보는 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경부선’이라 부른다. 외국인에게 설명하려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노선’이라는 해설이 필요하다. 교통은 소통인데, 그 이름조차 불친절하다면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명 중심의 명칭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국민에게 직관적이다. ‘서울–부산선’, ‘익산–목포선’이라 하면 어느 누구라도 곧장 노선의 범위를 알 수 있다. 둘째,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호남선’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익산–목포선’이라 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자부심을 갖게 된다. 셋째, 국제적 소통에 유리하다. 외국인 여행객이나 해외 철도 관계자가 한국 철도를 이해하기 쉽고, 이는 곧 국가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현실적으로도 기존 명칭은 시대와 괴리되어 있다. ‘호남선’은 호남 전역을 포괄하는 듯 하지만 종착지는 목포다. ‘경춘선’은 경기도와 춘천을 잇는다는 뜻이지만, 지금은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영동선’이라 하면 영동지방을 떠올리지만 실제 구간은 태백선과 연결되어 있어 오히려 혼동을 준다. 이런 불일치 속에서 국민은 여전히 낡은 이름을 사용하며 불편을 감수한다.
물론 전통적 명칭의 역사성과 국민적 친숙함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병기(倂記) 방식이다. 예컨대 ‘서울–부산선(경부선)’, ‘익산–목포선(호남선)’처럼 병기하면 된다. 역사적 맥락은 존중하면서도, 실용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사용 빈도를 지명 중심으로 옮겨가면 국민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이다.
열차 노선명 개편은 결코 거창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부 표지판 교체, 노선도 개편, 안내 방송 조정 정도면 충분하다. 수십조 원이 드는 SOC 건설과 달리, 몇십억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수십 년째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교통망의 이름을 국민이 이해하기 불편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자 무능이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 브랜드와 지역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이고, 이름은 그 첫 관문이다. ‘서울–부산선’이라는 명칭 하나가 곧 서울과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간판이 된다. ‘익산–목포선’이라는 이름은 호남의 관문을 직접 드러낸다. 철도 명칭 개편은 곧 지역 발전의 촉매제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지름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철도 노선명 개편은 작은 변화 같지만, 그 파급력은 크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교통 언어를 만드는 일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대한민국 교통의 얼굴을 세계 무대에 내놓는 작업이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순간이다.
열차노선은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이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명으로 불러야 한다. 서울–부산, 익산–목포, 춘천–서울….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다. 철도는 단순한 철길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도시와 도시를 잇는 생명의 혈관이다.
이름부터 바로잡을 때, 대한민국의 교통은 진정으로 세계와 호흡할 수 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