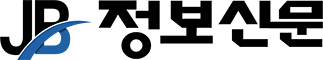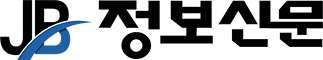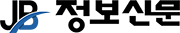본 연구는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과 아동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범죄위험, 보행안전, 인구 밀집도, 안전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안전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및 보행안전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가로등, CCTV 등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 결과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일부 지역은 이미 여성안심귀갓길, 어린이 보호구역,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등 안전 환경 조성 정책이 적용된 지역으로 확인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제주지역 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환경 개선 우선 대상 지역 △아동보호구역 설정 △분산된 안전정책 통합관리 및 안심제주 앱 고도화 △노인 안전 개선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안전 환경 개선 우선 대상 지역: 여성안전 측면에서는 구좌읍이 주요 사업 필요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동안전 측면에서는 애월읍, 한림읍, 노형동, 봉개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보호구역 설정: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스쿨존 외에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을 포함한 아동의 일상생활 공간 전반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분산된 안전정책 통합관리 및 안심제주 앱 고도화: 실시간 위험 정보 제공, 외국어 지원 등 사용자 맞춤형 안내, 안전 인프라 활용 방법 등 안전 교육 콘텐츠 제공 기능을 통합한 종합 안전 플랫폼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통합된 관리 운영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 안전 개선책 마련: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인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야간 조도 확보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생활안전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를 수행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민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도내 여성과 아동의 안전취약지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