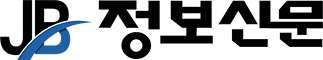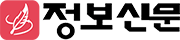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은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정부의 불완전한 공식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많은 아동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동 사망의 포괄적 조사 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복지 지원(75만 원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심각하게 불일치하여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한국일보)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동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살해 시도 후 생존한 아동(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분석 기준, 2018∼2024년 62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심리 지원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다음으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으며(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 및 미상 310명),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부모의 자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태어 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복지 지원의 격차이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는 25만 원에 불과하여 75만 원의 명확한 차별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