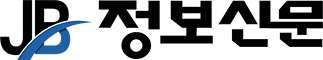‘바람이 허락하는 섬’ 추자도를 아십니까? |
육지 사람으로 그저 청명한 바람과 푸른 바다가 좋아 정착한 제주도, 안정된 직장을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난데없이 어딘지도 모를 추자면사무소에서 근무하란다. 울렁이는 속을 부여잡고 도착한 추자도의 첫 이미지는 사실 절망이었다. 점심시간 밥도 먹지 않고 면사무소 뒷산 중턱에 올라 북쪽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 옛날 연북정에 오르던 유배 선비들의 마음을 헤아리곤 했었다.
그랬던 내가 2년 만에 또 추자도를 지원해서 왔으니 참으로 인생 모를 일이다. 도대체 추자도의 무엇이 나를 다시 이리로 불러냈을까?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길래 남들은 한번 오기 힘들어하는 곳에 지원하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참 할 말 많은 추자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추자도는 후풍도로 불리었다.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섬, 추자도는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에 위치하는 까닭에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험한 바람과 파도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던 아주 고마운 존재던 것이다. 후풍도란 이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역사서에 그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는 명언으로 유명한 최영 장군의 추자도와 관련된 일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고려 후기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원나라가 설치한 말 목장 관리 몽골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최영 장군이 전함 314척·정예군 25,605명과 함께 출정한 일이 있었다. 출정 전후 모두 험한 풍랑을 겪은 군대는 추자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최영 장군은 한 달가량 머무는 동안 섬사람들에게 볏짚을 이용한 그물 짜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추자도에서는 이를 기리고자 사당을 세우고 매년 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고마움이 6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히지 않고 이어져 아직도 추자도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상상해 보라! 일평생 봐왔던 배와 사람이래 봤자 적은 수에 불과할 추자도 사람들에게 그토록 거대한 병선과 병사의 무리가 끝도 없이 포구로 몰려드는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었으리라. 고려의 병사라 하나 이들이 있는 동안 그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두를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막막했을 것이다.
사실 그 옛날 전쟁은 민초들에겐 적군이건 아군이건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최영 장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이어져 온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청렴하고 대쪽 같은 최영 장군의 성품이 틀리지 않았음을 잘 알게 해주는 방증이다. 추자도 사람들에게 있어 주민에 대한 수탈을 금지한 지엄한 군령, 이에 그치지 않고 민초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장군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정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자도에서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역사적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허락한 덕에 늘 바깥세상과 소통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그들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갔다.
또한 그 덕에 추자도는 최영 장군 이야기를 비롯해 천주교 박해 역사의 한 주인공인 황사영의 아내 정난주와 아들 황경한의 비극적 이야기, 아기업개의 슬픈 전설이 깃든 묵리 처녀당 이야기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추자도를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오시는 분들이든 감성돔의 당찬 손맛이 그리워 오시는 분들이든 바람이 만든 이야기들에 귀 기울인다면 추자도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31 (토) 01:14
2026.01.31 (토) 01:14